영화 ‘바울’ vs 미니 시리즈 ‘더 바이블’
2019-10-30영화 ‘바울’ vs 미니 시리즈 ‘더 바이블’
월드뷰 10 OCTOBER 2019●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CULTURE & WORLDVIEW 3 |
글/ 남정욱(대한민국 문화예술인 공동대표)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장군이 있었다. 장군의 어린 딸이 정체 모를 병에 걸렸는데, 마침 장군의 감옥에 기독교인 의사가 있었고, 그가 딸의 병을 낫게 하자 장군은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로마 시대 배경 기독교 영화의 이야기 전개다. 기-승-전-회개라는 기독교 영화의 대표적인 패턴인데 이때 가해자가 나쁜 놈일수록 감동은 더 커진다. 모두에게는 아니고 기독교인들에게나 그렇다. 비(非)신자들에게 호의적인 평가를 기대하긴 어렵다. 예술의 반대말은 비(非)예술이 아니라 규칙(規則)이니까.
영화 ‘바울(Paul, Apostle Of Christ)’
2018년 개봉작 ‘바울(Paul, Apostle Of Christ)’은 그런 의미에서 살짝 신선하다. 로마 장군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나쁜 인간은 아니다. 그리고 아픈 딸이 낫기는 하는데, 그 즉시 회개하거나 개종 같은 것도 하지 않는다. 다만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조금 더 친밀한 대화를 나눌 뿐이다. 바울도 ‘쿨’하다. 장군에게 예수의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면서도 “그렇다고 설득하려는 건 아닙니다.”라며 어느 지점에서는 말을 멈춘다. 장군도 그냥 빙그레 웃고 만다. 그래서 신선하다. 그래서 현실적이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더구나 로마인들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다. 몇 대째 내려온 집안 신(神)에 대한 신앙을 치유 한 번의 체험으로 쉽게 내던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긴 이유도 로마의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 인색했기 때문이다.

영화 ‘바울’ 포스터.
영화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 위해 로마에 오는 것으로 시작한다. 로마의 분위기는 흉흉하다. 도시의 절반 이상을 파괴한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네로가 범인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첫 장면은 꽤 자극적이다. 주위를 살피며 걷는 누가의 옆으로 이상한 가로등이 보인다. 사람이다. 사람이 등불을 들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타면서 등불 역할을 하고 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를 시각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 설정한 장면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기록상’으로도 사실이다. 타키투스의 책을 보면 ‘역청을 칠한 뒤 불을 붙여 정원 등불로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다. 타는 쪽이나 역겨운 냄새를 맡아가며 길을 걷는 사람이나 둘 다 고역이었을 것이다. 간간이 비명도 들린다. 산 채로 태웠다는 얘기인데 로마인들의 잔인한 성격상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누가가 로마에서 접선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끄는 작은 기독교 공동체다. 두 사람은 당시 유행하던 대표적인 부부 전도조(傳道組)였는데 초기에는 여성에게도 중요한 사역을 맡겼던 기독교가 점차 여성을 밀어내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가 로마 가톨릭으로 변질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누가 역할을 맡은 배우는 제임스 카비젤이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로 나왔던 인물인데 급을 낮춰 제자로 나왔으니 아무리 영화라지만 이래도 되나 싶다. 은밀히 선을 넣어 감옥으로 바울을 만나러 간 누가는 아예 침식을 같이하며 바울의 기억을 문서에 옮긴다. 영화 속 사건은 그다지 강렬하지도 그렇다고 마냥 심심하지도 않은 수준이다. 혈기왕성한 청년들은 복수하겠다며 로마군에 피해를 주고 싶어 안달이고, 중년들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며 말린다. 그리고 약간의 충돌, 딸의 치료 마지막은 바울의 참수로 끝난다. 영화 속 바울의 이미지는 진중하다. 편지 쓰듯 꾹꾹 눌러 말을 하는 그의 모습은 포교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구도자에 가깝다.
미니 시리즈 ‘더 바이블’
반면 2013년 방영된 미국 미니 시리즈 ‘더 바이블’에 등장하는 바울은 가볍고 발랄하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재기가 넘치는 바울은 틈만 나면 베드로를 가지고 논다. 그러나 내면에서도 그렇게 명랑했을까? 혹시 그것은 예수의 공생애 기간을 운 좋게 같이 보낸, 복 받은 자에 대한 질투와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한 바울 나름의 방어기제는 아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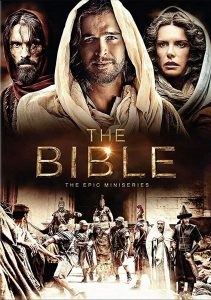
미니 시리즈 ‘더 바이블(10부작)’의 포스터.
바울은 예수를 ‘듣고’ 회심한 후에도 3년 동안이나 유대 땅을 밟지 않았다(혹은, 못했다). 3년 만에 찾은 예루살렘에서 그는 겨우 보름을 머물렀을 뿐이고, 다음 방문은 무려 14년 후였다. 예수의 원 제자들도 사람이다. 그들은 바울의 전력(前歷)이 불쾌했을 것이고, 당연히 이는 경원시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내내 떠돌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예수를 받아들인 그의 숙명이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베드로의 몫이 되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울의 몫이 된 것이 전략적 합의의 결과였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바울에게는 그것 말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고달팠던 이 ‘종교 천재’가 보내야 했던 그 고난의 행군은 절대 ‘전도 여행’으로 불러서는 안 될 만큼 험난하였다(근거 없는 편견이지만 나는 베드로의 이름에서는 고뇌가 느껴지지 않는다. 베드로에게는 ‘고민’이 느껴질 뿐이다).
후대의 평가도 가혹하다.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을 ‘예수의 가르침을 최초로 오염시킨 자’라고 비난했고 니체(Nietzsche)는 ‘증오를 부추기는데 천재성을 지닌 사람’으로 바울을 깔아뭉갰다. 심지어 ‘바울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세상을 위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작가도 있었다. 그러나 (가당치 않은 가정이지만) 베드로와 바울 둘 중 하나만 있어야 했다면 과연 그것은 누구였을까? 영화 ‘바울’과 ‘더 바이블’을 보며 내내 머릿속을 떠돌던 질문이었다.
<collecter1@naver.com>
글 | 남정욱
작가이며 출판·영화·방송 등 문화부문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숭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저서로는 <편견에 도전하는 한국사>, <결혼> 등 다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