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는 왜 ‘평화주의’가 아닌가
2021-06-14
월드뷰 JUNE 2021●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매거진 | ISSUE 12 |
글/ 조평세(트루스포럼 연구위원)
“인류사는 곧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총 11권으로 구성된 <문명 이야기(Story of Civilization)>의 저자로 유명한 역사학자 윌 듀란트(Will Durant)는 3421년의 인류 역사 중 전쟁을 겪지 않은 해가 고작 268년 미만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인간 정부는 생존이나 패권 혹은 이념을 위해서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도 전쟁을 일으켜왔다. 한편 근대국가의 기원과 형성을 연구한 사회학자 찰스 틸리(Charles Tilley)는 “전쟁이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라는 명언을 내놓았다. 사실 대한민국이 그렇다. 건국 2년 만에 발생한 6·25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으로만 부각되곤 하지만, 대한민국은 사실상 이 전쟁을 통해 그 국가 정체성이 확립되었고 세계가 놀라는 빠른 경제발전의 바탕을 일구었다.
전쟁의 참혹함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전쟁이 인간사의 필연적 현상이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기독교인이 찬성하거나 지지할 수 있는 전쟁이 있을까. 기독교인이 반대하거나 경계해야 할 ‘평화’는 또 있을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가” 낫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말처럼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나은 것일까? 이 질문에 접근하기 위해, 교부 어거스틴부터 아퀴나스와 칼빈을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기독교의 “정의전쟁론(just war theory)” 전통을 검토해보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여겨지는 C. S. 루이스의 입장도 살펴본다.

전쟁이 정당할 때
어떤 전쟁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교부 어거스틴은 국가가 때론 공공의 정의와 안전 그리고 악에 대한 제지와 형벌을 위해 전쟁을 일으켜야 할 필요성과 상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전쟁(just war)”이라는 표현을 썼다. 또한, 정당한 전쟁을 치르는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 징집된 개인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적당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며 오히려 군사력으로만 심각한 악행을 막을 수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고집해 무력사용을 피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조금 더 나아가 “정당한 전쟁”이 충족해야 할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첫째, 정당한 전쟁은 ‘적법한 주권자(rightful sovereign/authority)’에 의해 명령이 내려져야 하며, 둘째, 상대국의 악행에 대한 방어와 같은 ‘정당한 명분(just cause)’이 있어야 하고, 셋째, 참여하는 전투원들이 선을 증진하고 악을 막고자 하는 ‘올바른 의도(right intent)’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정당한 전쟁론,” 혹은 정의전쟁론의 기준은 종교개혁 이후 서구의 자연권(natural law) 전통과 함께 일반화되고 영국과 미국 등의 자유민주적 공화주의 정치사상에 뿌리를 내렸다. 이후 정의전쟁론은 더욱 체계화되어, 전쟁은 모든 평화적(외교적) 노력이 고갈된 뒤의 최후의 수단(last resort)이어야 한다는 것과 제한된 목적에 비례하는 적절한 수단(proportional means)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개입을 통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합리적 가능성(reasonable prospects of winning)이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의 원칙들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기 이전의 정당성(jus ad bellum) 뿐만 아니라 전쟁 도중 민간인 구분과 전쟁포로 처리 등의 ‘전쟁 중 정의(jus in bello)’,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및 전후 처리와 평화재건 등의 ‘전쟁 이후 정의(jus post bellum)’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반인륜적 패권 국가들과 그 축(axis)의 위협을 자각한 국제사회는 전쟁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정립하고 유엔과 같은 국제외교의 장을 세우면서 정의전쟁론의 주요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실제로 유엔 헌장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조약에는 천부적 자연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비롯해 정의전쟁론의 기본인식이 잘 녹아있다. 특히 유엔은 1990년대에 일어난 아프리카와 동유럽 등의 여러 인종학살에 대한 대응으로 2001년에 현대판 정의전쟁론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독트린을 정립해 제시했다.
2005년 9월에 열린 세계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R2P는 크게 3개의 기둥 체제로 구성되는데, 제1기둥은 개별국가가 제노사이드(genocide),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 범죄로부터 보호할 1차적 책임을 말하며, 제2기둥은 국제사회가 개별국가의 이러한 1차적 책임 이행을 적절히 지원할 책임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제3기둥은 해당 국가가 자신의 1차적 책임 이행에 명백히 실패하고 이를 지원할 평화적 해결 수단이 고갈되었을 때 국제사회가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집단적 군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서 이 제3기둥 체제가 발동될 때, 즉 국제사회가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될 때의 명분을 충족하는 기준들이 다름 아닌 정의전쟁론에서 그대로 반영되었다.
타인의 ‘다른 뺨’을 돌려대서야…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입장은 산상수훈 등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당방어와 같은 대표적인 전쟁 명분을 부정하셨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마 5:38, 39)”라는 구절 등을 인용하며, 악인이 악을 행해도 사랑으로 덮고 “오래 참는(고전 13:4)” 것이 “화평케 하는 자(peacemaker, 마 5:9)”인 기독교인의 본분이고 그 어떤 형태의 폭력도 기독교 신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명백히 왜곡한 것이다.
프린스턴 대학의 저명한 기독교 윤리학자 폴 램시(Paul Ramsey) 교수는 “다른 뺨을 돌려대라”라는 말씀이 개인 차원의 대응이라면 몰라도 국가 정부 차원의 대응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예수님은 원수 앞에서 ‘자신의’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악인에게 고통받는 ‘다른 사람의’ 뺨을 돌려 대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당연히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라 강도를 돕는 행위가 된다. 더구나 피통치자의 권리를 일부 위임받아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정부가 악인의 악행을 막기는커녕 ‘국민의 뺨을 돌려 대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억눌린 자를 보호하고 돌보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물론 보편 상식과 가치관에도 맞지 않는다.
또 다른 흔한 개념 왜곡은 무력사용의 의도(intent)를 구분하지 못하고 선악의 개념을 상대주의적으로 해석해 악인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묵인하는 경우다. “누군가의 테러리스트는 또 다른 누군가의 자유 투사(one man’s terrorist is another man’s freedom fighter)”라는 흔한 궤변이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자유 투사와 테러범의 차이는 역지사지 차원의 상대성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가치관의 차이다. 일례로 테러범은 민간인의 살상을 극대화하여 공포(terror)를 조장하는 것이 그 목적인 반면, 자유 투사는 민간인의 살상을 최소화하면서 특정 대상을 저지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훙커우 공원의 상하이 전승 기념행사에서 일본군 주요 장성들을 목표로 투척 된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폭탄투척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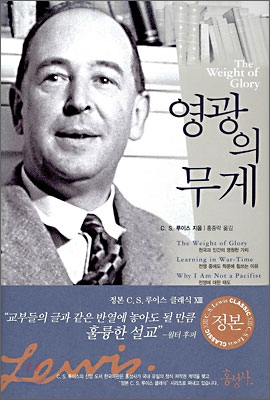
C. S. 루이스와 평화주의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이자 작가로 평가받는 C. S. 루이스는, 옥스퍼드 재학시절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전투 중 심장에 너무 가까이 박혀 제거하지도 못한 파편을 품은 채 전장에서 돌아온 전력이 있다. 전쟁을 통해 인간의 가장 흉악한 면모를 가까이 접한 그는 종종 전쟁의 참혹함에 관해 쓰기도 했다. 그리고 전쟁이 어떤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 고통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1차 세계대전의 슬로건은 “모든 전쟁을 끝낼 전쟁”이었다). 하지만 루이스는 “평화주의자”가 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전쟁을 인간 악의 절정을 보여주는 현실로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화주의라는 낭만적 추상의 허상을 꿰뚫어 보았다.
유럽에서 또다시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자신의 학생들이 대거 전쟁터로 향하게 되었을 때 그는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독일의 패권과 반인륜적 만행을 막아내기 위해 영국이 전쟁에 돌입해야 한다는 생각은 더욱 확고했다. 자신도 참전을 자원했지만 거부당했고 대신 정보부에 들어갈 것을 권유받았다. 하지만 프로파간다와 역정보 등의 거짓말을 양산해야 한다는 업무에 가책을 느껴 거절하고 옥스퍼드시 민방위대대에 자원해 파트타임으로 보초를 서기도 했다. 당시는 지식인들, 특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평화주의’에 대한 논의가 점점 활발해지던 때였다. 그런 상황에서 루이스는 학생 대부분이 전쟁터에 나가 비교적 고요해진 옥스퍼드의 어느 평화주의 모임에서 “나는 왜 평화주의자가 아닌가”라는 강연을 했다. (이 연설은 <영광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그의 저작에 수록되어 있다.)
인간 양심의 의미와 본질, 그리고 개인은 언제나 그 양심의 목소리를 따라야 한다는 서두로 이야기를 시작한 루이스는, 양심의 호소에는 다음의 네 가지 근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전쟁의 불가피함을 풀어낸다. 바로 개인의 경험, 역사적 사실, 도덕적 직관, 그리고 신성한 권위가 평화주의적인 입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제한된 경험과 인식은 특정 전쟁이 언제나 선보다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으며 오히려 역사적 사실은 모든 전쟁이 항상 결과적으로 선보다 해악을 끼쳤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 또한, 도덕적 직관도 모든 상황에서의 중립적 “평화”를 호소하고 있지 않다. 가령 A가 B를 부당하게 공격했을 때 B를 돕는 여러 방법 중에는 A에 대한 어떤 무력도 때론 수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루이스는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전통을 이야기하며 “다른 뺨을 돌려대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쟁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정의전쟁론의 기독교적 관점도 설파한다.
무엇보다 루이스는 오직 자유 세계에서만 소위 평화주의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경향을 지적하며 이러다간 종국에 전쟁이 없어지긴 하겠지만 전체주의 이웃 국가의 치하에 살게 될 것이라고 꼬집는다. 결정적으로 그는 기독교 세계관을 견지하는 입장에서 다음의 통찰을 던진다. “전쟁이 어떤 경우에도 무엇보다 가장 큰 악이라고 주장하는 신조는, 사실 죽음과 고통이 곧 최고 악이라고 믿는 물질주의적인 윤리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간이 하는 어떤 일도 고통을 뿌리 뽑을 수 있다는 확증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최선의 결과를 이뤄내는 사람들은 보편적 정의와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감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면한 과제에 성실히 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위협하는 적으로부터 생명과 자유와 같은 마땅히 지켜야 할 천부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목소리에 대해, 현 정부·여당을 비롯한 많은 정치세력과 여론은 “전쟁이라도 하자는 거냐”라고 반문한다. 하지만 이는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라는 말만큼이나 비겁한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이미 70년째 전쟁 중이다. 북한 정권은 그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대남도발과 테러, 그리고 대량살상무기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해왔다. 그런 적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불사하는 ‘각오’는 ‘전쟁을 원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나쁜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으로의 초대장일 뿐이다.
<pyungse.cho@gmail.com>

글 | 조평세
영국 킹스컬리지런던(KCL)에서 종교학과 전쟁학을 공부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트루스포럼 연구위원으로 미국에 거주하며 보수주의 블로그 <사미즈닷코리아>(SamizdatKorea.org)를 운영하고 있다.


